구글과 저작권, 그리고 문화접근

본문

MAGAZINE
For the Love of Culture
Google, copyright, and our future.Lawrence LessigJanuary 26, 2010 | 12:00 am
 2002년 초, 미국 최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중 하나인 찰스 구겐하임(Charles Guggenheim)의 딸이자 An Inconvenient Truth를 만든 데이비스 구겐하임의 여동생인 그레이스 구겐하임이 상식을 깨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다. 찰스 구겐하임은 백 편이 넘는 다큐멘타리를 감독하거나 제작했었다. 유명한 >Nine from Little Rock과 Monument to a Dream도 여기에 포함된다. 잊혀진 것도 있지만 (가령 A Time for Justice처럼) 20세기 미국 역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그의 다큐멘타리들이다. D-Day Remembered처럼 아름답기만 한 작품도 있다. 이런 다큐멘타리들에 대해 그레이스 구겐하임은 이 다큐멘타리를 리마스터링해서 당시 떠오르는 플랫폼이었던 DVD 출시를 하기로 하였다.
2002년 초, 미국 최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중 하나인 찰스 구겐하임(Charles Guggenheim)의 딸이자 An Inconvenient Truth를 만든 데이비스 구겐하임의 여동생인 그레이스 구겐하임이 상식을 깨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다. 찰스 구겐하임은 백 편이 넘는 다큐멘타리를 감독하거나 제작했었다. 유명한 >Nine from Little Rock과 Monument to a Dream도 여기에 포함된다. 잊혀진 것도 있지만 (가령 A Time for Justice처럼) 20세기 미국 역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그의 다큐멘타리들이다. D-Day Remembered처럼 아름답기만 한 작품도 있다. 이런 다큐멘타리들에 대해 그레이스 구겐하임은 이 다큐멘타리를 리마스터링해서 당시 떠오르는 플랫폼이었던 DVD 출시를 하기로 하였다.그런데 그녀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다. 분명한 문제 하나와, 별로 분명해 보이지 않은 문제 하나였다. 분명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였다. 필름 50편을 디지탈화시키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다. 분명하지 않은 다른 하나는 법적 문제였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배급을 하기 위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기 아버지 작품을 자식이 정리하겠다는데 법적 문제가 뭐냐고 물을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할아버지의 옛날 책상을 다시 칠하거나 이웃에게 팔기, 혹은 부엌 탁자나 작업대로 쓴다 할 때 법적 문제가 될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그레이스 구겐하임이 다루려 하는 아버지의 유품은 특별한 종류의 것이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다큐멘타리는 특수한 종류의 재산이다. 저작권과 계약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편집물의 부담이 엄청나게 복잡해졌다.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부분적으로 어느 영화이건 복잡한 저작권법이 따른다. 영화라는 것이 음악과 시나리오, 캐릭터, 이미지 등 온갖 요소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한 편 만들면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고와 DVD로 옮기는 수고 또한 원저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게 할 수 있다. 다큐멘타리의 경우는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된다. 필름 클립 안에 인용이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가령 알터(Jonathan Alter)가 지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책을 보면 유명인사들의 인용이 나온다. 1960년대에 나온 시민권에 대한 영화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명인사들의 발언이 나온다. 다만 책과 다른 점이 있다. 영화에서의 인용은 CBS나 NBC 뉴스 영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영상 클립을 영화에 집어 넣을 때마다, CBS나 NBC에게 허락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CBS나 NBC는 기꺼이 허락을 해 준다. 적어도 괜찮은 값에 말이다.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만 할 때도 있고,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사용을 금지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인용을 위한 허가 확보는 보통 잘 이뤄지는 편이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변호사들이 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인용자가 얻어야 할 권리를 정의내리는 약정을 그들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런 인용을 얻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얼마나 이상한지, 영화 제작자들 대부분은 생각해본 적이 없잖을까 의심스럽다. 가령 대공황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인용하기 위해 뉴욕타임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 공공 연설을 인용할 때에도 허락이 필요할까? 그런 정도의 "사용(use)"이라면 "정당(fair)"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적어도 저작권 법 하에서 말이다. 하지만 다큐멘타리 대부분(실제로 제작자 대다수)은 "공정사용(fair use)"과 같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개념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영화 내 인용 사용권을 개별로 라이센스받아왔다. 가령 여기서 받는 라이센스는 해당 인용만 그 대상으로 한다. 공정사용은 아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의 정의와 범위를 특정짓는다. 기간은 5년, 북미지역 배급, 교육용 등의 규정이다.
그렇다면 5년 뒤 영화를 배급하고 싶은 제작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저작권 원소유주에게 다시 가서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언뜻 듣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을 듯 하다. 다큐멘타리 안에 들어가는 클립 하나 뿐 아니던가? 하지만 그 클립이 스무 개, 서른 개가 넘는다면? 원소유주를 다 찾아낸다치더라도, Eyes on the Prize같은 유명한 시리즈의 소유주들로서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시리즈의 제작자이자 촬영감독이었던 엘스(Jon Else)가 이 문제를 2004년에 묘사하긴 했지만 해결까지 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리즈는 이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 운동역사를 거의 유일하게 보여주는 시리즈인데요. 싸게 만들어놓고는 자금모으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최소 5년간 권리를 살 정도 뿐이었습니다. 시리즈의 각 에피소드를 보면, 그 중 50%가 그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상용 소스로부터 나왔죠. 5년 라이센스가 끝났을 때, 이 영화를 만든 회사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라이센스 권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텔레비전 방송도 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교가에 너덜너덜해진 복사본 정도나 있을까요. 이 영화의 권리를 다시 사려면 5억 달러가 들어갈 겁니다.
American University’s Center for Social Media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권리 정리비용(clearance cost)이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치솟아서, 다큐멘타리 영화에 대한 '공공 접근(public access)'을 제약하였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20세기에 찍은 다큐멘타리 절대 다수를 합법적으로 복구하거나 재배급할 수 없어졌다. 그저 필름 도서관 서랍 안에 놓이고, 많은 수가 작동불능화 되어가고 있다. 질산염-기반의 필름으로 만들어졌고, 대다수가 잊혀졌으며, 어느 누구도 이 필름을 갖고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다큐멘타리 영화 대부분은 태어날 때 각종 계약때문에 고아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가솔린의 납과 마찬가지이다. 피할 수 없는 독성에 대한 인식 없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레이스 구겐하임처럼 말 그대로 후계자가 되는 경우만 예외적이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든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다시 모조리 재취득하는, 비범한 일을 해냈다. 8년 뒤, 대부분의 작업을 그녀가 끝냈고, 여섯 편의 대작이 살아남았다. 바로 그 해, 그녀 아버지의 제일 유명한 다큐멘타리, 1968년 민주당 경선과 케네디의 암살 때까지 약 두 달을 그린 Robert Kennedy Remembered가 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에서 DVD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가을, 하버드 법학도서관의 희귀도서 자료관을 처음 들어갔었다. 주 자료실(Elihu Root Room) 끝은 고서함으로 가득차 있는데, 플라톤의 국가론(Πολιτεία: 기원전 380년)보다 더 오래된 책도 있었다. 제일 오래된 책을 이 상태로 어떻게 보존했는지가 궁금해서 가서 봐야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다. 사서가 나를 탁자로 인도하였고, 나는 오래된 페이지를 주의깊게 넘겼다.
물리적인 서적, 그리고 서적 안에 있는 저작권화된 컨텐트는 대단히 강력한 인공 문화물이다. 어디에서건 출판된 책을 접할 수 있다. 법학 도서관에 속하는 희귀도서관에 들어갈 때에도 꼭 하버드 대학 교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책을 읽기 위해 직접 손을 댈 필요도 없다. 미국은 1923년 이전 책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출판사를 포함하여 누구나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다.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말이다. Hamlet을 새로이 출판하기 위해 셰익스피어에게 갖다 주어야 할 저작권료도 없다는 의미다. 미국 내 19세기 작가들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따라서 19세기 작가들의 작품은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널리 퍼져있다.
사실 저작권에 여전히 걸려있는 책이랄지라도 널리 퍼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유로이 최신 그리셤 소설을 마음대로 출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서관들의 엄청난 노력(그들이야말로 헤라클레스 급이다) 중고서적 유통망을 통해, 기본적으로 무슨 책이건 접할 수 있다. 여러분 동네 도서관이 그 책을 구해가지고 거의 무료로 공유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중고 서적으로 살 경우, 극장 절반 값으로도 책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책에 대한 접근과 다큐멘타리 필름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다른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 시간대가 지나면, 출판된 모든 서적(전부는 아니다. 그림책과 시집,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저작물은 분명 제외가 될 것이다)의 재출판과 재유통은 가능하다. 오래 전에 죽은 저자의 어떠한 상속권자도 출판물에 대한 접근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20세기에 제작된 다큐멘타리 필름 절대다수는 영원히 변호사의 서랍 안에 갇혀있다. 합법적으로는 꺼내볼 수 없다. 필름 제작 당시에 받은 여러가지 허락때문이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다큐멘타리도 책처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이 인용을 사용하는 방식(즉, 허가가 전혀 필요 없다)대로 영상 클립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비슷하게 본다면, 책 또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원저자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인용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라이센스에 맞는 경우에만 인용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다큐멘타리처럼 만들었다면, 오늘날 모든 책의 사용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돌려 말해서, 다큐멘타리를 책처럼 만들었다면 거의 모든 다큐멘타리를 시청 가능했을 것이다.
듀크 대학 법대 교수인 제이미 보일(Jamie Boyle)에 따르면, 전혀 생각 없이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문화역사의 우연에 따른 결과가 그것이다. 보일은 이 결과를 "계약에 따른 문화환경의 결과"라 칭하였다. 합법적으로 언제나 읽을 수 있지만, 시청은 언제나 합법적으로 못하지만 말이다. 책과 다큐멘타리의 이 차이점은 우리의 미래에 경고를 내리기도 한다. 향후 수백년 동안 문화를 지배하게 될 규칙은 무엇일까? 한 페이지 볼 때마다 변호사 한 명을 동원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큐멘타리-영화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알고, 문화의 미래를 보장하면서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확인시켜주는 세상을 만들게 될까?
II.
미국 출판사협회(AAP)와 미국 작가협회(AGA)가 구글에게 제안한 합의문안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2004년, 구글은 인터넷 이상주의자들이나 희망했을만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800만 서적의 스캐닝 및 온라인화이다. 서적의 종류에 따라 접근권이 나뉘어지는데, 저작권이 없는 서적의 경우 완전한 접근권을 구글이 보장한다. 심지어 디지탈 복사본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 하에 있는 서적의 경우, 구글은 저작물 일부에 대한 접근만을 보장한다. 즉, 검색한 단어나 문구 주변 정도만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책을 어디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는지 구글이 정보를 내준다. 미처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사들이 원하는만큼만 구글이 책의 일부를 보여주게 된다.
작가협회와 출판사협회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탈 기술에 대해 저작권법이 생각하는 식대로 본다면,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구글이 1,800만 권의 서적을 스캔해서 인덱스화시켜 놓는다면, 구글은 이 서적의 "복사본"을 만드는 셈이다. 협회측에 따르면 저작권 하에 있는 서적의 경우, 구글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스캔하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아 놓아야 한다. 구글이 단순히 인덱스화만 시켜놓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이 있는 책의 사용할 수 있는 복제본을 허락없이 배포하는 것은 물론 금지이다. (물리적으로 복사본이 없는 경우, 도서관이 대체용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예외이다.) 협회측에 따르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말이다. 이 허락이 없는 경우 구글은 불법복제를 자행하는 꼴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800만 서적 중 16% 정도는 문제가 없다. 저작권이 없는 도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서적의 경우 구글은 마음대로 복제할 권리를 지닌다. 9% 정도는 아직 미출판 상태인데, 이 경우도 스캐닝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볼지는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다. 출판물에 대해 간단하고도 저렴하게 마케팅할 수 있으니 출판업자들에게도 기쁜 일이다. (구글 책검색을 발표하기 전에 모두들 서비스에 사인을 했었다.) 하지만 나머지 75%가 문제다. 출판업자와 작가들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여기에 속하는 서적은 고아들이랄 수 있다. 적어도 전체적인 수준으로는, 저작권법을 겨냥한 허가 확보가 효과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구글은 이런 저작권이 있는 서적의 "사용(use)". 즉, 이들을 인덱스화시키고 단순히 인덱스 검색이 가능하게 해 주는 정도는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 간주하고 있다. 충분히 변형해서 사용하는 한, 스캔하기 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글이 소송에서 질 경우 어떻게 될까? 저작권 판례에 대한 한, 법원이 안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많았다. 구글로서는 엄청난 배상(liability)을 해야하게 된다.
그래서 합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글은 합의를 하였다. 물론 구글 내부 관측통들은 배상에 대한 공포때문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구글은 자신들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라는 주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한다. "공정사용"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저자가 쓴 서적(저작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의 20%까지 권리금을 주게 된다. 그리고 2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완전한 접근을 하기 원하는 이들이 지불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로열티를 원하는 작가에게 주기 위한 비영리 재단에게 이 자금이 주어진다. 고아(저자가 사라졌되 저작권이 남아있는 서적) 다섯 명 중 하나를 무료로 살려내는 셈이다. 구글도 이제 1,800만 장서를 디지탈 라이브러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합의를 평가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다. 법적 소송은 비싸며, 불확실하고, 해결에 수 년이 걸린다. 이 합의는 "공정사용"의 경우보다, 오히려 무료 컨텐츠에 보다 더 많은 무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합의이기도 하다. 20%는 푼돈보다 더 나으며, 돈을 작가에게로 넘기는 유통망 시스템은 정말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회사와 선량한 영혼들이 구글의 합의를 공격하고 나섰다. 반독점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구글이 누가 무엇을 읽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리라는 두려움도 있다. 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미다. 또한 금세기 "디지탈 거인 (지난 세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다)"에게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의 주된 목표들을 보면, 진짜 걱정해야 할 사항을 오히려 누락시키고 있다. 이번 합의가 구축하게 될 미래가 야기할 문제점들이다. 반독점 문제가 아니다. 프라이버시, 혹은 이미 지배자로 나선 인터넷 기업에게 너무나 광대한 권력을 주게 된다는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따로 있다. 구글 합의가 합의가 아니라는 문제다. 이 합의가 고착화시키게 될 문화환경이 바로 문제다. 과거의 문화-환경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서적의 다큐멘타리화(化)이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165 페이지 짜리 합의문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한다. (첫 20페이지 정도는 "정의(definitions)"만 있으니 넘어가도 좋다.) 실제 합의문을 읽느니 차라리 트위터 버전이 더 나을 것이다. 책 한 권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무료인지, 혹은 언제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정하는, 그러한 간단한 규칙이 아니다. 실제 규칙은 대단히 복잡하다. 책이 "무료(free)"인지의 여부는 그 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신문 잡지의 경우는 보통의 책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 사진이 있는 책도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구글의 합의는 페이지마다, 어쩌면 인용어구 하나마다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글자 하나 하나,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핵발전에 대한 옛 글로건의 정반대다. 모든 비트를 측정(meter)해야 한다. 그 측정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극장 표나 야구게임 표를 팔듯,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팔기 시작한다. 디지탈 라이브러리가 아니다. 디지탈 북스토어이다. 스타벅스가 없는 Barnes & Noble이다.
나는 이 문제를 이론적인 문제로만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몇 달 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부인이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다. 낳은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의사들이 황달을 걱정하였다. 그날 밤, 아이는 심각한 혼수상태에 빠졌고, 우리는 의사를 불렀다. 그는 두 시간 후에 보고하기를 원하였다. 차도(差度, improve)가 안생길 경우, 그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오기 원하였다. 차도는 보이지 않았고, 난 아이를 자동차 시트에 태우고 가까운 곳의 아동병동으로 갔다.
의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난 구글로 황달에 대해 검색을 하였고, 기사를 하나 읽어냈다. 다행히도 이 기사는 American Family Physician이 인터넷에 무료로 펴낸 기사였다. 두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의사는 빌리루빈 과다현상(hyperbilirubinemia)을 걱정하였고, 나도 거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러다 기사의 중요한 부분을 보았다. 표 하나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표가 있는 페이지를 보자 표가 없었다. 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권리 소유자(rightsholder)가 전자 미디어 형태로 동 권리 소유물의 재생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놓여 있었다. 이 표를 무료 배포할 라이센스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배포가 막혀 있었다. "궁금하시면 당신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도록 시켜보슈"라는 의미로 들렸다. "우리, 변호사들이 해결해 드리지요."
어쩔 수 없이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앉아 있어야 했다. 내 딸의 미래는 커녕 우리 문화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미친 상황에 벌써 다다른지 그 때까지 몰랐다는 점 또한 놀라웠다. 이 때의 경험때문에 긴급 의문이 생겨났다. (아이는 지금 괜찮다.) 이런 질식할만한 문화 환경으로 계속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생각할 수 없을까? 책 안에 있는 모든 인용에 대해 감찰하는 변호사들을 풀어놓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지금 방침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옛 시스템으로는 미처 알지 못한 복잡한 무언가를 안겨다 주지는 않을까? 이런 과도한 통제가 과연 새로운 혁신인가? 정말 진보하는 것이 맞나?
어떻게 생각하시건, 미래의 약속이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만들지를 우선 보시기 바란다. 실제의 도서관에서 접근권은 페이지 수(혹은 페이지 이미지) 정도까지 통제하지 않는다. 책 수량(혹은 잡지, CD, DVD) 정도에서 제한을 가할 뿐이다. 그리고 도서관 전체를 검색하는 것은 무료이다. 읽고 싶은 책 확인도 무료이다. 실제 도서관은 시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지만, 물론 시장 안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유아 놀이방처럼, 도서관 내부는 바깥 시장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
이런 자유가 진짜 자유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상관 없이 검색할 수 있으며, 수단에 상관 없는 독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한 모든 문화를 볼 수 있다. 이윤이 될만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 볼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뭔가 배울 기회 정도는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실제 도서관에서 갖는 접근권은 저작권이 효과적으로, 의미가 있게 규제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간의 잘 짜여진 균형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균형이다. 실제 도서관 세상에서 과거는 저작권이 침투하지 않는 세상이며, 설사 저작권이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이 교훈을 오늘날 모두 잊었다. 저작권법이 제아무리 어떤 관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하고, 문화를 이용하는" 때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망각하고 있다. 저자와 출판업자들에게 문제가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문화를 사용하고, 즐기며, 비판해온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됨을 말하고자 함이다. 미시간 대학교의 법대 교수, 리트만(Jessica Litman)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의 미국 저작권법은 기술적인 법이었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다루지 않았고, 많은 이들에게도 상관이 없던 법이었다. 저자나 책, 혹은 지도, 차트, 그림, 조각, 사진, 음악, 연극,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각각의 산업을 낳았다. 책 판매업자나 축음기 업자, 영화 제작자, 음악가, 학자, 국회의원, 평범한 소비자 등 모두가 저작권 문제 없이 이 산업에 접촉할 수 있었다.
90년이 지난 후, 미국 저작권법은 더더욱 기술적으로 변했고, 여전히 일관성이 없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작권은 현대 사회의 사적 소유물(paraphernalia)을 옹호하는 법이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142 페이지이다. 법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텍스트만으로 보면, 재생산과 전송을 일상화시켜 놓을 경우, 잠재적으로 소송이 가능해지도록(actionable) 저작권법이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서야, 저작권법에 한 시간마다 한 번씩은 걸리게 될 것이다.
저자 대부분은 저작권법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저자라면, 여러분의 저작물은 두 번의 활기찬 삶을 지니게 된다. 첫 번째 삶에서 저작권의 독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두 번째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 출판중에 있을 때 출판을 위해서 독점 저작권이 필요하다. (아니, 출판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번 출판되고나면, 저자가 볼 때, 적어도 이 저작물은 무료가 되어버린다. 저서 한 권을 팔 때마다 돈 버는 것은 중고서적 업자들이고, 도서관의 경우 책을 움직일 때 요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중고서적이 판매될 경우 저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다.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되더라도 저자에게는 아무 것도 안돌아간다. 도서관의 비영리 행위와 중고서점의 영리행위는 모두, 저자(혹은 그의 변호사)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돌아가는 보수(補修) 없이 일어난다. 게다가 저작권법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복사본이 새로 생기지 않았고, 새로운 저작물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뭔가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저작권은 이러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소유주(가끔은 저자 자신이기도 하다)는 아무 것도 못얻는다.
별로 안좋아할 저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 읽는데 반하여, 도서관이 작가에게 매년 2.5 달러씩 지급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저자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이 세상이 만들어낸 무료 접근이야말로 우리 문화가 걸어온 본질적인 부분임을 아셔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숙제 때문에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보낼 때, 읽어야 할 책의 20%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당연히 책 모두를 읽기 바라실 것이다. 돈을 내야하는 책만 읽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계속 의문을 만들어내면서 책 검색을 하기 바라실 것이다. 가령 구글이나 위키페디아를 검색하면서 의문을 갖는 방식처럼 말이다. 우리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부를 일이 별로 없는 문화 생활을 쌓아 왔다. 저자들(출판업자들로 봐야 할 경우가 많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좋았다.
그런데 그러했던 과거를 이제 급진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것도 복제(copies)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에서 우연히 생긴 기능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저작물의 모든 가능한 사용에 대해 규율하는 법을 실제 세상에 적용시킨다는 의미이다. 디지탈 세상에서 저작권법은 모든 것을 규율한다. 복제본의 모든 사용 하나 하나를 저작권법이 규율한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어느정도, 모든 사용권을 라이센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인덱스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진 서적 스캐닝도 저작권법을 불러오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건데, 스캐닝은 복제본을 만든다.
이것이 뭘 의미하건 우리는 책을 다큐멘타리 영화화시키고 있다. 이 점이 두렵다. 현재 서적 접근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법적 구조는 과거 영화 접근에 대한 법적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 문화에 대한 모든 접근을 규율하려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라이센스에 따라 말이다. 상대적으로 유명한 저작물이라면 모두가 다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건데, 우리는 지금 재앙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문화에게.
III.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법적, 기술적 코드 안에 우리의 문화를 묻어버리지 않을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구글이 아니다. 구글이나 다른 어떤 민간기업이 뭘할까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은 주어진 디지탈 기술로, 저작권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해냈다. 도서관과 대학기관에 있어서 구글 합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연구자들에게도 잠재력이 크다. 구글과 출판업계, 저자들은 내가 여기서 제기하는 종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접근에 대한 특혜(special favors)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합의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떠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기업들(그리고 준-독점 기업들)이 부여하는 특혜에 의존할 수 없다. 설사 그 특혜가, 적어도 처음에는 관대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제는 문화 접근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해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제아무리 합의가 뛰어나고, 기술이 우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은 없다.(There is nothing so useless as doing efficiently that which should not be done at all)"
기술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법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이 사실 문제다. 해결책은 법의 재구성이다. 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문화를 전체적으로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숭고한 목표를 이룰만한 법으로 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초안조차 마련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미 저작권 전쟁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단, 받아들일만한 평화가 어때야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첫 단계가 어때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법이 이루어야 할 분명한 변화는 두 가지이다. 아니, 비록 어려운 가치 선택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처분가능 소유물, 즉 재산(property)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만들며, 정부가 가진 최소한의 의무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연방정부가 만드는 처분가능 소유물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연방정부는 소흘히 하였다. 저작권법은 인류에게 알려진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비효율적이다. 우리의 저작권 시스템이 규율하는 것 절대다수가 누구 것인지 지정하기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할 정도다.
구글 합의는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고 있다. 자발적인 저작권 등록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등록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방법은 여전히 없다. 저작권을 유지하는 부담을 저작권 소유주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더 나은 해결책일지 모르겠다. 이 경우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적어도 정해진 시한 내에 말이다. 가령 책이 출판된지 5년이 흐르고나면, 국내 저작권 소유주는 자신의 저작권을 갱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 저작권은 공공 소유물로 전환된다. 성공적인 등록이란,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히 지정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국제적인 의무와 관련되어서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 소유주에게만 해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레짐 하에, 모든 나라가 동일한 규칙을 채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등록 운영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은 기업들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등록제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하며, 등록자가 등록 서비스를 완수하도록 할 뿐이다. 인터넷용 도메인 이름처럼, 등록업체들간에 경쟁이 일어나면 등록비는 떨어질 수 있다.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가치를 높이는 혁신도 일어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보자면 이런 등록제는 서적만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작업물의 다른 형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진이 그러하다. 그동안의 법을 보면, 저작물 보호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책 외의 다른 저작물도 등록제가 하루 빨리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시스템의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분명하다. 합법적인 잡초제거기 만들기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문화 접근 문제의 절대다수는 향후 기술이 갖는 급격한 잠재성을 예측하는데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과거는 용서할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디자이너들조차 인터넷의 중대성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된다. 영화와 음악, 그 외 다른 저작물들을 묻어버리는 법적인 암초를 제거해야 한다. 현재의 소유주들에게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끝없는 협상이 아닌, 단순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 재산 규칙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어야 하는지는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영화나 음반처럼 편집을 한 저작물이 14년 이상 되었을 경우, 현재 소유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작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확보해 놓는 방식이다. 즉, 그레이스 구겐하임과 그녀같은 사람들(물론 영화 제작사나 필름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이 재 라이센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영화를 자유로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복사 행위가 일어나건, 나지 않건, 보존행위(preservation) 자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준다.
그러나 보존 이상으로 나아갈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편집된 저작물의 영구적 권리(perpetual rights)를 정리할 간단한 방법을 법이 제시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입수 가능해지거나, 심지어 상용(commercially) 용도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말이다. 한편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진보가 필요하다. 영화 안의 음악처럼 편집된 저작물 안의 요소를 저작권화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가 출발이다. 그래야 저작물의 배급이나 접근이 가능해진다. 저작물을 하나 만들고나면, 우리 문화 안에서 저작물 자체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필요한 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한, 미래 어느 순간(14년 후)부터는 통제력을 잃게 된다.
J.J.에이브람스(Abrams)의 영화에 자기 노래가 나와도 될지 안될지를 결정할 권리는 당연히 작곡가에게 있다. 하지만 영화가 만들어진지 30년 후에도, 이 작곡가가 동 영화의 배포를 막을 권리를 갖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은 너무나 복잡하며, 공공선에도 안좋다. 법이 이런 시스템을 지탱해줘서는 안된다.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는 편집된 저작물 소유주가 어떠한 플랫폼이건 간에 오리지날 저작물의 배포권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런 편이 합리적이다.
물론 헌법은 의회의 귀속권(vested rights)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제한 자체도 제한적이다. 의회는 단순히 창조적인 작업물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없다. 정부가 권리를 청산하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권리를 재산법(property law)이 인정하는 것이 재산법의 전통이기는 하다. 가령 영화 저작권 소유주가 로열티의 20%를 저작권 취합 단체에 부여하여, 관련 소유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론상 수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작권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안겨다 주는 현재의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주들이 어째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복잡한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을까? 자기들 소유물이지 않나? 여기서 재산법을 다시 봐야 한다. 재산법은 소유주가 원하는만큼 소유물을 나눠줄 자유를 언제나 제한해왔다. 영국의 지주 가문은 자기 가문에 땅을 어떻게 분재할지 통제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온 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너무나 복잡해진다. 그래서 또 규칙이 등장하였다. 영구구속금지의 원칙(永久拘束禁止의 原則, rule against perpetuities)이다. 재산 소유주에게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이 원칙에 따라 재산의 이전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을 저작권에도 추천하고 싶다. 그래야 복잡한 약정으로 문화를 어지럽히는 변호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 접근권도 보존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는 제일 어렵다. 구 저작물만이 아니라 신 저작물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결정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시장을 제한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균형, 그 균형속에 만들어진 법이다. 200년에 걸쳐 만들어진 법으로서, 상업 가치를 어디에서 행사하고 어디에서 제한받아야하는지를 지정하고 확보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가끔은 그러한 제한이 저작물 기술의 부산물(by-product)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만, 책에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는 계획은 세워진 적이 없다. 적어도 실제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한 제한이 의회의 의도를 표현해 주는 것일 때도 있다. 가령 공공 방송을 허가하는 규정을 내세울 때 그러했다.
우리는 양측 모두 선의를 인식하고, 이해관계간 균형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다. 저작권 보호가 잘 작동하는 영역에서 저작권 보호를 걷어내면 새 시장을 파괴할 뿐이다. 과거에 접근성이 어땠든지간에 문화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장이 관장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된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접근을 무료로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자유를 법이 확보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겠다. 1976년, 저작권법 하에서 공중 라디오는 상당히 저작권법 덕을 보았다. 상당히 완화된 규정으로 음악 사용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인터넷 배포라는 새로운 형태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문화에 접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말이다. 제일 간단한 대응은, 원래의 자유를 새로운 미디어도 포함시키도록 업데이트시키는 일일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기존 레짐을 그대로 옮길(translation)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옮길 경우, 원래의 의미와 의도가 그대로 남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도서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은 어떨까? 정책 결정자들이 계획했을 수도 있고, 그저 법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환경 안에서 법의 한계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가 모호하다 하더라도, 그 모호함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미가 명백해졌다. 우리는 자유로운 접근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확실한 전망을 갖고있지는 않다.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만을 알 뿐이다. 한 쪽이 작용한다면 무시무시해질 것이오, 다른 한 쪽이 작용한다면(저작권 파괴론자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문화의 모든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가능해지겠지만 문화 다양성과 그 폭을 줄여버릴 수 있다. 난 저작권 파괴론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컨텐트 업계가 주장하는대로 극단적인 형태의 통제(문화의 모든 사용에 라이센스 부과)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과거를 갑작스럽게 부정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 대신 양 극단의 오류를 감안하고 필요에 따라 균형을 잡아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창조성을 지지해줄 인센티브와 함께, 세대별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확인이 그것이다. 너무 많이 요구하잖나싶기도 하다. 균형잡힌 공공정책이란 모순어법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글같은 기업들이 더 나은 법 제정이 아닌, 뛰어난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문화접근은 개인 기업과 개인 기업들의 약정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다. 법이 뒤쳐져 있어서 개인들간의 협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다. 합리적인 공공정책이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공공정책 자체가 긴급히 필요할 시점이다.
Lawrence Lessig is a professor of law at Harvard Law School. His latest book, Remix (Penguin), was published in paperback last year.
For more TNR, become a fan on Facebook and follow us on Twitter.
For The Love Of Culture | The New Republic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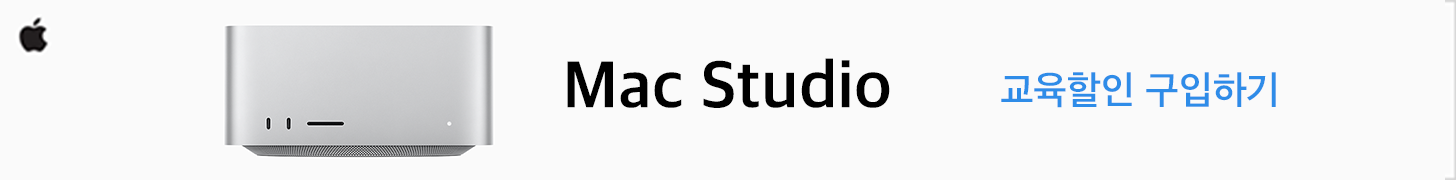









댓글목록 0